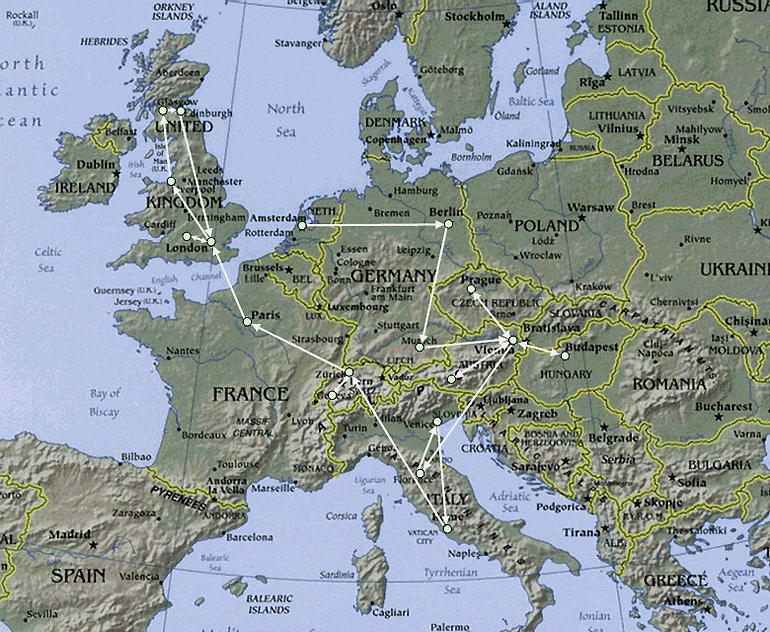2000 배낭여행 (1)
I. 아무튼 떠나자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던 2000년 여름…
저~ 바다 건너 멀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월말엔가 갓 제대한 친구 녀석과 술잔을 기울이다 갑자기 튀어나온 여행 얘기가 화근이 되어, 반년 동안의 빈틈(?)없고 지루한 준비 끝에 결국 이 아름다운 고국 산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린 남들과 달라’라고 연신 자부하며 학교 가방 하나씩을 달랑 매고 비행기에 몸을 싣긴 했지만 막상 처음 낯선 땅에 도착했을땐… 캬하하~~ 몸둘바를 모를 정도의 설레임과 무지하게 당황스러웠던 기억을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게대가 여행 초반부터 싸나이 가슴을 휘어잡던 그 추위… 역시 떠날 때 철저한 준비보단 무언가 껄적지근한 느낌들을 남겨두고 떠나와야 여행의 맛이 더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만… 39박 40일의 짧지만은 않은 기간이었지만 별 사고없이 무사히 여행을 마칠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단 여권과 돈을 모두 내가 휴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 녀석 군말없이 잘 따라다니더군요.^^;; 하지만 지금 다시 이렇게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웃음 지울 수 있는 건 모두 그 녀석 덕분입니다.
그때의 설레고 가슴 벅차던 기억들을 여기에 담아봅니다.
II. 배낭 하나 달랑 메고
ㅇ 들어가며
말 그대로 배낭 하나만 달랑 매고 떠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식량(먹을것) 따위는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학교 가방 하나랑 사진에서 늘 보이는 보조 가방(효자 가방)만을 들고 40일 내내 돌아다녔습니다. 남들은 그러더군요… ‘배태랑들이신가봐요’ 혹은 ‘그걸로 충분하나요’ 등등… 배태랑은 아니지만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v 집 떠날때 짐 많은 거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구요, 사진에 이쁜옷 많이 나와봐야 뭐하겠습니까 기동성만 떨어지고. 솔직히 큰 돈 주고 새로 가방 사기도 아깝더군요. ㅋㅋㅋ 그리하여 반팔, 반바지에 배낭 하나 달랑 매고 뱅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허나… @.@;
ㅇ 여행 목적
유럽 여러 나라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느껴 보기위해 떠났습니다. TV나 책으로만 봐왔던 이국의 문물들을 보고 느끼면서 문화적 충격(cultural shock)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이질적인 문화… 거부감은 생길테지만 최대한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ㅇ 여행 계획
중간 고사가 끝나고 5월 중순쯤, 개략적인 일정을 마음에 품고 여행사에 찾아가 항공권과 함께 Eurail Pass, Britrail Pass를 예약하므로써 여행 준비는 본격화 되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책을 하나 구입하고 달력에 표시를 해가며 구체적인 계획들을 짜나가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 유동적인 계획을 염두에 두고 대안들을 함께 준비하여 일정표 하나를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일정표는 정말 훌륭한 것이었죠. (나중에 느낀 거였지만 일정표를 만들때 참조했던 유레일 열차 시간표는 유럽 어디에서도 놀라우리만큼 정확하게 일치했고…)
각 나라에서의 체류 기간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 환전도 별 어려움없이 할수 있었구요. 물가가 비싼 영국에서의 일정을 길게 잡았던 이유는 유레일패스가 21일짜리였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느라 그러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영국을 너무나 동경했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우연찮게도 거의 대부분 영국 출신들이죠. 도데체 그곳의 분위기가 어떠하길래… 덕분에 여비의 절반 가량을 그곳에서 탕진해야만 했었구요.^^)
이렇게 계획을 짜고 여권과 배낭 하나를 달랑 매고, 드디어 홍콩을 경유하는 네델란드행 케세이 퍼시픽 항공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ㅇ 동반자
대학 동기이자 베프… 일관이와 함께…
ㅇ 여행 일정
떠나기 며칠전 아주 멋진 계획표를 만들었었답니다. 물론 아래 보시는 여행중 실제 일정표와 많이 다르지 않았구요. 각 나라마다 정확한 환전을 위해 일정 만큼은 확실히 해서 떠나고 싶었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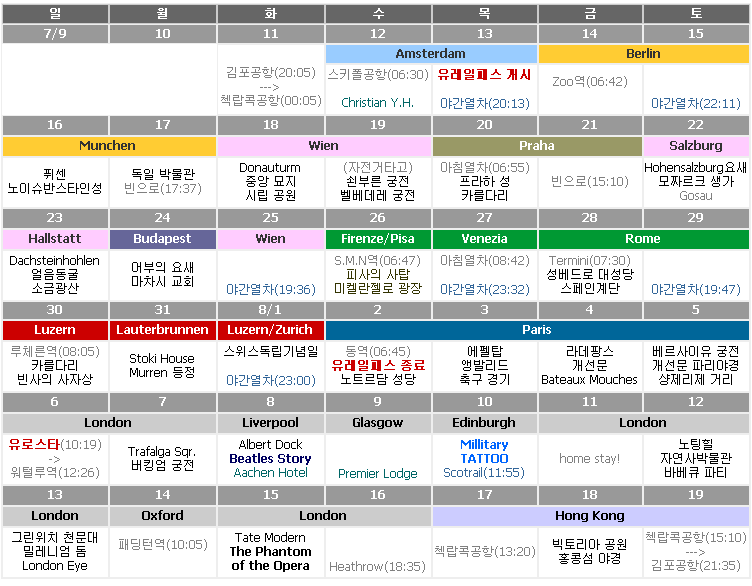
ㅇ 여행 루트
암스텔담->베를린->뮌헨->빈->프라하->빈->잘쓰부르크->할슈타트->빈->부다페스트->빈->피렌체->피사->베네치아->로마->루체른-> 인터라켄->라우터부루넨->취리히->파리->런던->리버풀->글래스고->에딘버러->런던->옥스포드->런던